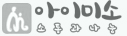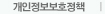| 제 목 | 동학 사상 (다 함께 읽어요~~) | ||
|---|---|---|---|
| 작성자 | 임미선쌤 | 작성일 | 2013-01-09 02:25:17 |
| 조회수 | 1,646회 | 댓글수 | 2 |
< 동학 사상 >
Ⅰ. 인간관
이 우주는 한울님의 기운인 ‘지기(至氣)’로 가득 차 있어, 지기(至氣)와 함께 서로 유기적(有機的)인 연관을 맺고 있고, 나아가 이 모두는 궁극적으로 무궁한 우주와 함께 ‘하나의 커다란 생명’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 곧 동학 의 우주관이다.
어느 종교나 사상을 불문하고 인간을 만물의 가장 존귀한 존재로 보고 있는 것은 매우 일반적인 현상이다. 그러나 동학에서는 인간을 다만 존귀한 존재로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무궁한 한울님’과 더불어 ‘무궁한 존재’로 보고 있음이 그 특징이 된다. 이와 같이 ‘유한적인 존재’인 인간을 신과 같은 ‘무한적 존재’, 곧 ‘무궁한 존재’로 보는 것은 다름 아닌 ‘시천주(侍天主)’, 곧 사람들 모두 그 내면에 매우 주체적으로 무궁한 한울님을 모시고 있다고 보기 때문인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동학의 인간관을 보다 분명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한울님을 모신다’는 ‘시천주(侍天主)’, 나아가 ‘시(侍)’에 대한 이해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하겠다.
대신사는 이 ‘시(侍)’라는 글자에 대하여 『동경대전』 가운데 주문(呪文)을 해석하는 대목에서 “시(侍)라는 것은 안에 신령이 있고(內有神靈), 밖으로는 기화가 있어서(外有氣化), 온 세상 사람이 각각 깨달아 한울님과 내 몸은 서로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불이(不移)의 관계에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즉 ‘한울님을 모셨다’는 ‘시(侍)’의 상태란 다름 아니라, 안으로는 신령스러운 영(靈)이 있음을 느끼며, 밖으로는 어떠한 신비한 기운과 동화(同化)를 이루는 느낌을 갖게 되면서 나(인간)와 한울님이 떨어질 수 없는 존재임을 스스로 깨달아 실천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면 이렇듯 대신사가 설명을 하고 있는, 안으로 느껴지는 ‘신령스러운 영(靈)’이란 과연 무엇일까? 이는 다름 아니라 ‘나’의 주체이며 동시에 한울님의 마음이 된다. 그러면 밖으로 느껴지는 ‘신비한 기운과의 동화(同化)’란 무엇인가? 이는 곧 나의 기운이 한울님의 기운과 서로 일치함으로써 일어나는 작용이라고 하겠다. 따라서 이는 안팎으로 느껴지는 신령스러운 영(靈)인 신령(神靈)의 작용이 되는 것이다. 즉 안으로는 신령이 자리하게 되고, 밖으로는 이 신령과의 동화작용이 일어나고 있다는 말이 된다. 따라서 안과 밖이 둘로 나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일치를 이루고 있는 것이라고 하겠다.
즉 ‘신령(神靈)’은 ‘기화(氣化)’를 통하여 활동을 하게 되고, 이러한 ‘기화(氣化)’로 이룩되는 ‘신령(神靈)’의 활동을 각기 깨우쳐서 한울님과 내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고 이를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을 대신사는 ‘각지불이(各知不移)’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시천주의 ‘시(侍)’란 신령(神靈)스러운 한울님 마음과, 기화(氣化)라는 한울님의 실천적 삶이 하나가 되어 각지불이(各知不移)를 통하여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이와 같은 면에서 본다면, 시천주(侍天主)란 곧 내 안에 자리한 한울님, 곧 나의 ‘참주체’가 되는 영(靈)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한 치도 그 뜻에 어긋남이 없이 행동하며 살아감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아울러 이러한 ‘시’를 통해서만이 자신의 진아(眞我)이며 또한 우주의 본체인 한울님을 자신의 안에서 회복할 수 있으므로, 대신사는 이 ‘시천주(侍天主)’로 동학의 가장 핵심적인 사상을 삼은 것이라고 하겠다.
이러한 ‘시천주’의 상태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신인합일(神人合一)의 경지이며, 인간이 이 우주에 화생(化生)할 때 한울님으로부터 품부(稟賦)받은 바로 그 천심(天心)을 다시 회복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그런가 하면, 이는 곧 자신의 삶 속에서 ‘한울님 마음’을 한 치도 어김없이 실천하는, 그러한 삶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그러므로 ‘시천주’는 곧 인간이 태어날 때의 가장 순수한 마음, 즉 인간 마음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며, 나아가 이를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이 된다.
즉 시천주란 무궁한 존재인 한울님을 내 몸에 모시고, 그 무궁한 한울님의 삶을 나의 삶 속에서 실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나’ 역시 무한한 우주와 더불어 ‘무궁한 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동학의 인간관은 바로 이러함을 통하여 ‘무궁한 나’를 깨달아 가는 데에 있는 것이라고 하겠다. 이렇듯 ‘무궁한 나’로서의 존재를 깨달아 가는, 동학의 인간관은 궁극적으로 올바른 세상을 열어가는 데에 있어 가장 필요한 이상적인 인간형이기도 하다. 즉 이는 각자위심(各自爲心)에 물들어 자신의 이기주의적 탐욕만을 찾아 서로 다투고 싸우는 세태 속에서, 한울님의 덕을 회복하고 또 한울님의 덕과 일치하는(與天地合其德) 삶을 영위함으로써 동귀일체(同歸一體)의 세상을 지향하는 지상신선(地上神仙)의 모습이기도 한 것이다. 이렇듯 사람을 한울님과 더불어 ‘무궁한 존재’로 본 동학의 인간관은 전대(前代)의 어느 성인(聖人)도 천명하지 못한 대신사의 매우 독특한 인간관이다. 그런가 하면, 바로 이러한 점에서 대신사가 천명한 가장 탁월한 인간관, 나아가 동학의 인간관의 한 특징적 모습을 찾을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동학의 인간관은 대사회적(對社會的)인 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띠고 있다고 하겠다. 이는 다만 어느 특정한 신분의 사람만이 ‘무궁한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내 안에 한울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빈부(貧富)나 귀천(貴賤)의 구분 없이 세상 사람이면 누구나 무궁한 존재로서 평등하다는 본질적인 평등주의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동학의 인간관은 신분과 제도로, 또 존비(尊卑)의 차별이 분명했던 봉건사회를 뛰어넘을 뿐만 아니라, 오늘이라는 현대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하게 요구되고 있는 인간관이라 하겠다. 즉 동학의 인간관은 인류의 역사 속에서 전근대와 근대를 지나며, ‘모든 인간은 무궁한 존재로써 평등하며, 또 평등해야 한다.’는 그러한 자각을 억압된 민중들에게 불어넣었을 뿐만 아니라, 차원을 달리해서 인간 스스로 무궁한 신과 더불어 무궁할 수 있다는 새로운 자각을 불러주기에 충분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본원적 만인 평등의 사상과 아울러 질적 차원의 변화를 통하여 무궁한 존재로서의 자신을 깨달을 수 있는 동학의 인간관은 불균형의 삶을 영위함으로써 불안한 현실과 비전 없는 내일을 살고 있는 현대의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희망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러한 동학의 인간관은 진정한 인간의 가치가 무너져 내리면서 ‘물화(物化)와 소외(疎外)’라는 전도(顚倒)된 가치만이 강조되고 있는 현대적 모순을 극복하고, 인류에게 미래에의 새로운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바로 이와 같은 의미에서 ‘무궁한 우주’와 더불어 ‘무궁한 나’를 자각함으로써 체득(體得)하게 되는 동학의 인간관은 새로운 미래와 세상을 이룩할 수 있는 오늘이라는 현대에 있어 가장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는 그러한 인간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Ⅱ. 동학의 신문화운동
3·1독립운동 이후 천도교 청년당은 민족의 문명의식 고취와 새로운 문명, 문화를 통한 민족정신 함양을 위하여 청년운동·출판문화운동·농민운동·어린이운동·여성운동 등 각 계층을 망라한 전방위적인 문화운동을 전개하였다.
3·1독립운동 이후 민족의 문명의식 고취와 새로운 문명, 문화를 통한 민족정신 함양을 위하여 동학은 거국적인 신문화운동을 전개하게 된다. 이들 문화운동은 주로 3·1독립운동 이후에 전개한 것으로, 청년운동·출판문화운동·농민운동·어린이운동·여성운동 등 각 계층을 망라한 전방위적인 문화운동이라고 하겠다.
1. 청년 운동
동학은 3·1운동 후 교역자들이 대부분 체포·투옥 당하여 한때 그 공백을 면치 못하는 어려움을 겪었다. 이러한 때에 젊은 청년교인들 중심으로 선열의 정신을 이어 받아 새로운 진로를 모색하고자 하는 운동이 전개된다.
이것이 곧 1919년 9월 2일 발족된, 민족의 신문화 창조·계발과 새로운 사상·교리의 연구 보급을 목적으로 청년교인들이 중심이 된 천도교청년교리강연부(天道敎靑年敎理講硏部)이다.
이 청년 조직은 전국 각지에 지부를 설치 확대하면서, 다음해 4월에는 천도교 청년회로 이름을 바꾸고, 편집부사업으로 개벽사(開闢社)를 설치하여 우리 나라 최초의 종합잡지인 월간 「개벽」을 발간하는 한편, 순회강연을 실시하고, 또 체육부사업으로 야구단을 조직하여 활동하였으며, 신체조를 보급하는 등 문화운동을 주도해 나갔다. 그리고 1921년 청년회 소년부사업으로 천도교 소년회를 조직하여 어린이운동에 앞장서기도 한다.
그 후 1923년 9월에는 청년회를 발전적으로 해체하여 천도교 청년당을 창립하였다. 청년당은 급속도로 발전되어 1925년에 지방당부 120여개에 당원수 3만여 명을 확보하였고, 7개 부문운동을 전개하여 농민운동, 노동운동, 소년운동, 여성운동, 학생운동, 청년운동, 상민운동 등 각 계층 부문에 걸쳐 눈부신 활동을 전개하면서, 매년 11월 1일을 ‘포덕의 날’로 정하여 계몽에 앞장섰다.
또한 청년당은 1926년 5월부터 ‘신인간 자학(自學)’ 제도를 창설하였으며 1927년 12월에는 조선정형(情形)연구회를 설치 운영하였다. 그 후 청년당은 1931년 2월 16일에 그 동안 별도로 활동해오던 천도교 청년동맹과 합동하여 천도교 청우당(天道敎靑友黨)으로 개칭하여 더욱 활발한 운동을 전개하였다. 이리하여 1932년에는 당학(黨學)제도를 창설했는데, 다음해에는 이를 발전시켜 우리나라 최초의 통신대학강좌로서 「자수대학강의(自修大學講義)」를 간행 실시하고, 1934년에는 기관지 「당성(黨聲)」을 통한 계몽교육에 힘썼다.
그러던 중 청년당 안에 비밀리에 항일핵심조직으로 오심당(吾心黨)을 조직하여 독립운동 거사를 모의하여 오다가, 이것이 1934년에 왜경에 탄로되어 230여 명의 간부당원들이 투옥 당하게 되었다. 이어 1937년 중일전쟁과 함께 일제의 강압으로 그 후 동학의 청년조직은 지하로 잠적하게 되었다.
2. 출판문화운동
동학은 3·1독립운동 이후 「개벽(開闢)」지 발간을 비롯한 출판·문화 활동에 치중하여 당시 우리 나라의 출판문화운동을 단연 주도해 나갔다. 「개벽」지는 1920년 6월에 창간, 1926년 8월까지 통권 72호를 내고 일제의 강압으로 폐간 당한 잡지다. 우리 나라 최초의 종합잡지로서 「개벽」은 1920년대의 문화·사상계를 대표하는 잡지로 그 위치를 점하고 있다. 「개벽」지의 발간정신은 그 제호가 말하듯 동학의 개벽사상을 의미한 것이며, 동학의 이념 구현에 뜻을 두면서도 종교적 색채를 나타내지 않고 사회 대중계몽에 주력하였다.
또한 「개벽」지는 민중지로서의 특성을 보이면서, 민중을 위한 민중의 잡지임을 자처하였다. 또 한편 「개벽」지는 항일 민족저항잡지로서 수 없이 많은 고난을 겪었다. 따라서 창간호가 압수 당하여 임시호를 낸 것을 비롯하여 발매금지 34회, 삭제 벌금 정간 등의 탄압이 잇따랐고, 초기 4년 동안 발행권수 43만 4천여 권 중 무려 4분의 1에 해당되는 11만 2천여 권이 압수를 당하였다.
한편 「개벽」지의 성격은 종합교양지이면서 문학지적 특성을 보이고 있어, 우리 나라 근대문학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기도 했다.
「개벽」지가 1926년 발행금지를 당한 후, 동학은 「별건곤(別乾坤)」(1926년 창간, 통권 103호), 「혜성(慧星)」(1931년 창간, 통권13호), 「제1선」(1932년 창간, 통권11호) 등을 연이어 발간하고, 이밖에 「학생」(1929년 창간, 통권18호), 「중성(衆聲)」(1929년 창간), 「새벗」(1929년 창간) 등 수 많은 정기간행물을 발행하였다. 또한 계층별 독자를 위한 「어린이」지와 여성지, 농민지 등이 별도로 간행되기도 하였다.
3. 어린이 운동
동학은 어린이 운동을 위하여 1921년 5월 1일 청년회 내에 천도교 소년회를 창립하고 전국 순회강연을 전개함으로써 우리 나라 최초로 소년운동을 제창하였다. 즉 소년운동의 선구자인 김기전, 방정환 두 분에 의하여 ‘어린이 정서 함양’, ‘청소년의 윤리적 대우와 사회적 지위’를 위한 운동을 동학의 인내천 정신에 맞추어 전개시켜 나갔던 것이다. 아울러 방정환 선생이 어린이운동을 통해서 ‘어린이’라는 호칭을 사회적으로 보편화시켰다. ('어린이'라는 말을 처음 사용한 사람은 육당 최남선(1890-1957), 1914년 「청춘」 창간호 '어린이의 꿈'이라는 권두사에 어린이라는 말이 처음 사용됐다.)
그리고 다음해인 1922년 5월 1일, 천도교 소년회 창립 1주년을 맞아 이날을 ‘어린이의 날’로 선포하고 역사적인 첫 ‘어린이날’ 행사를 대대적으로 시행하였다. 즉 오늘 우리 나라에서 행해지고 있는 ‘어린이 날’은 바로 이렇듯 천도교 어린이 운동에 의하여 비롯된 것이다. 이후 이를 범사회적 운동으로 확산하기 위하여 1923년 4월 17일 다른 종교의 소년단체와 연합하여 조선소년운동협회를 조직, 협회본부를 천도교 당 안에 설치하여 매해 5월 1일을 ‘어린이날’로 선포하는 동시 세계 최초의 ‘어린이 헌장’이라 할 수 있는 ‘소년운동의 기초조항’을 선포하게 되었다. 한편 이 운동의 일환으로 「어린이」지를 월간으로 발간 보급하였는데, 「어린이」지는 1923년 3월 20일에 창간하여, 1934년 7월까지 통권 122호까지 내고 정간되었다가 해방 후 통권 137호를 끝으로 폐간되었다.
이 「어린이」지는 동학의 인내천사상을 바탕으로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 자유를 이념으로 하여 어린이를 민족 장래의 주인공으로 인식하고, 어린이에 대한 재래의 비인간적 폐습을 혁신시키는 동시에, 어린이 운동 및 이를 보다 정서적으로 융화 발전시키는 아동문학 창달에 크게 기여하게 된다.
4. 신교육운동
보수적 민족주의가 한학위주(漢學爲主)의 구학문(舊學問)에 집착하면서 선진문물을 수용하는 신교육을 외세에 추종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고루한 태도를 보인데 반하여, 동학 의 진보적 민족주의는 신교육 운동에 누구보다도 앞장을 서는 열의를 보였다.
동학 3세 교조인 의암성사는 일본 망명시 64명의 국내 유수한 젊은이를 일본에 유학시킨 바 있다. 이러한 동학 의 교육에 대한 열의는 「황성신문」(광무10년 2월 14일자)에 ‘사손병희씨 열의교육(謝孫秉熙氏熱意敎育)’이란 논설이 실린 것만 보아도 동학 가 신교육운동에 얼마나 많은 심혈을 기울였는 지를 알 수가 있을 것이다.
동학 는 보성전문학교와 동덕여학교를 비롯하여 용산에 양영학교와 선덕여학교, 마포에 보창학교와 삼호보성소학교, 청파동에 문창보통학교, 청주에 종학학교, 안동에 봉양의숙, 선천에 보명학교, 전주에 창동학교, 대구 교남학교와 명신여학교 등 31 개 학교를 운영하는 한편 전국적으로 야학강습소를 개설하여 문맹퇴치 등 민중교육 내지 민족교육에 크게 공헌하였다.
이렇듯 민족 교육을 위한 동학 의 신교육 운동은 민족의 암흑기에 민족의 의식개혁과 새로운 세계문명을 깨우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이상과 같이 소략하게 기술한 동학 의 신문화운동의 특성과 그 의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간추릴 수 있다.
첫째, 개벽사상을 배경으로 낡은 문화의 청산과 새로운 민족문화의 창조를 추구하여 낡은 사상과 제도와 인습에서 벗어나 새로운 가치관과 인간관의 정립으로 문화혁신을 도모하였다.
둘째, 인내천 사상을 배경으로 한 인간주체의 신문화창조를 추구하여 인간이 물질이나 정신의 속박에서 벗어나도록 인간회복 내지 인격해방에 앞장을 섰다. 따라서 전근대적인 봉건사상을 배격하고 배금주의에 빠지는 자본주의 내지는 유물사관의 사회주의를 다같이 부정하는 입장을 나타냈다.
셋째, 보국안민사상을 배경으로 민족주의 성향을 지니고 민족 전통문화를 살리는 민족주체성에 투철하면서 동시에 서구의 문물을 진취적으로 수용하는 입장을 나타냈다.
넷째, 민중을 대상으로 민중을 위하고 민중을 바탕으로 하는 민중문화운동으로서의 특성을 나타냈다.
댓글목록
황필선님의 댓글
lovchuu 작성일동학 사상에 대해 차분히 읽어볼 수 있는 글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읽었습니다^^
조교님의 댓글
아이미소연구소3 작성일예습차원에서 방정환선생님과 동학에 관련된 자료를 미리 읽어볼 수 있어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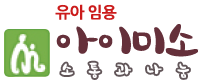





 인사말
인사말
 유아임용 합격사다리
유아임용 합격사다리
 공지
공지
 강의 신청
강의 신청
 전체도서
전체도서








 어울림마당 행복한 만남
어울림마당 행복한 만남